요약
이 영상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평균 올려치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평범한 삶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하락을 지적합니다. 주택 소유, 소득, 직업, 학력, 결혼,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제 통계와 미디어 속 이미지를 비교하며, 평범함의 기준이 왜곡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청년 세대의 좌절감, 연애·결혼 포기,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분석하고, 미디어에 의해 과장된 평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평범한 삶'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 실제 통계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균 이하라고 느끼는 것은 착시 현상
-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청년 세대의 자존감 하락,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이어짐
- 미디어에 의해 과장된 평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대한민국 평균 올려치기 문화 [0:00]
최근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에 평균 올려치기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평범한 인생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평범한 삶은 실제보다 훨씬 화려하게 묘사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부가 합쳐 월 700만 원 정도를 벌며 수도권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삶이 평범하다고 여겨집니다. 중년에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손주들을 보며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일반적인 노년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실제로 평범한 것인지,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삶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 [0:46]
대한민국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약 1,500만 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약 30%입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상위 30%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젊을수록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30대의 주택 소유율은 더욱 낮습니다. 30대 전체 인구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즉, 30대의 4분의 3은 집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으로 범위를 좁히면 주택 소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결혼 적령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위 20%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1:31]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은 월 320만 원 정도입니다. 30대의 평균 소득은 344만 원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균 소득은 고소득자들이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위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위 소득은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중위 소득은 264만 원 정도입니다. 이 소득 주변에 분포된 사람들이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4~500만 원은 벌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이며, 이로 인해 250만 원 정도를 버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자리 현황 [2:59]
일반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 등이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 일자리는 약 16%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이 62%, 비영리 기업이 21%를 차지합니다. 대기업 일자리 중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생산직을 제외한 대기업 정규직 사무직은 더욱 적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7.5%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치입니다.
학력, 결혼, 노후 준비 [4:14]
인서울 4년제 대학 졸업은 여전히 중요한 학력으로 여겨지지만,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인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약 11%에 불과합니다. 30대가 되면 모두 결혼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가 미혼 상태이며 특히 30대 남성은 이미 절반을 넘었습니다. 미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니는 노년의 모습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7%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노후를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권으로, 노인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미디어의 영향 [6:28]
결론적으로, 제시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은수저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절반 이상이 탈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면서 이들이 평범함의 이미지를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그들의 삶이 평범해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S에는 잘 사는 이야기만 노출되고, 그곳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범하게 보이고 표준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세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론 [9:15]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평균은 과장되어 있으며, 나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미디어가 우리 귀를 죽이는 느낌이 들더라도, 나까지 내 길을 죽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교 속에 갇혀 옥살이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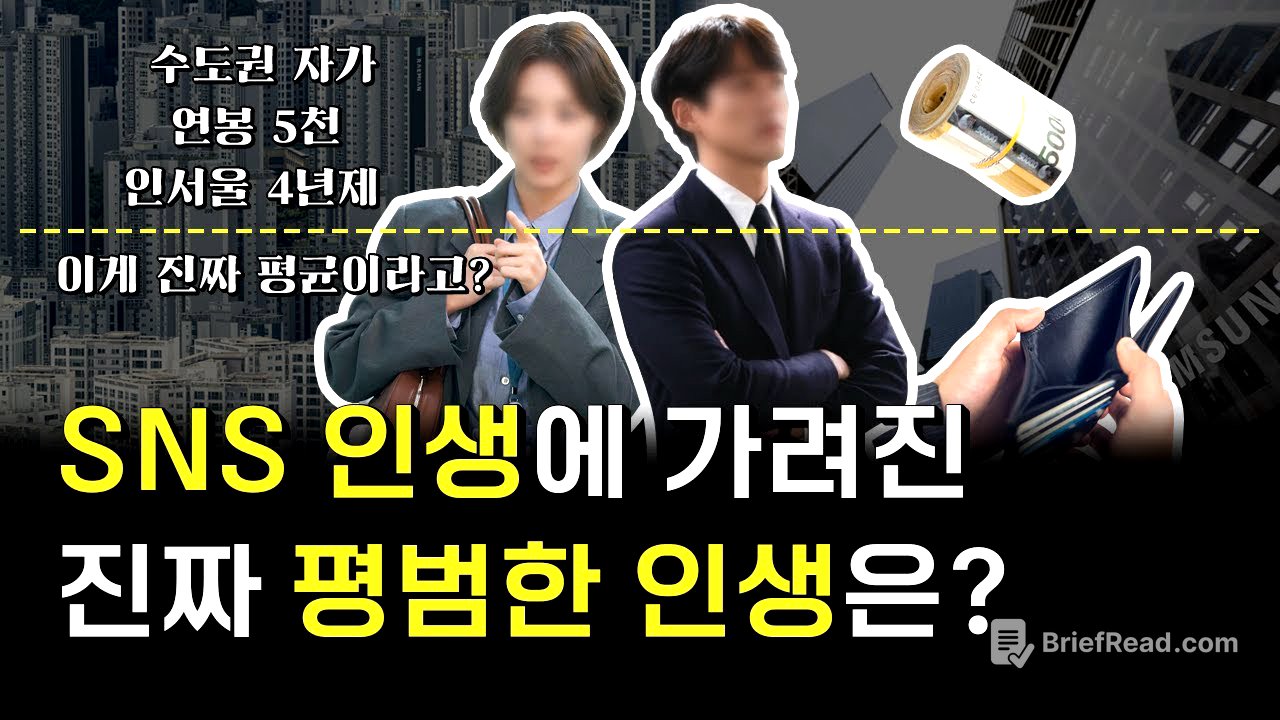
![[한균수의 순.정.남] 아픈 손가락, 이제는 사야 됩니다](https://wm-img.halpindev.com/p-briefread_c-10_b-10/urlb/aHR0cDovL2ltZy55b3V0dWJlLmNvbS92aS9MNFZ6TV9ObU0yYy9ocWRlZmF1bHQuanBn.jpg)




![[3부 풀버전] 왜 무서운 것을 보면 안되는가? 인간의 뇌와 무의식적 활동, 박문호 박사 | 방송대 | 방통대 | 방송통신대 | 꿈 | 공포영화 | 환상](https://wm-img.halpindev.com/p-briefread_c-10_b-10/urlb/aHR0cDovL2ltZy55b3V0dWJlLmNvbS92aS9kWGFrczZSMGVNTS9ocWRlZmF1bHQuanBn.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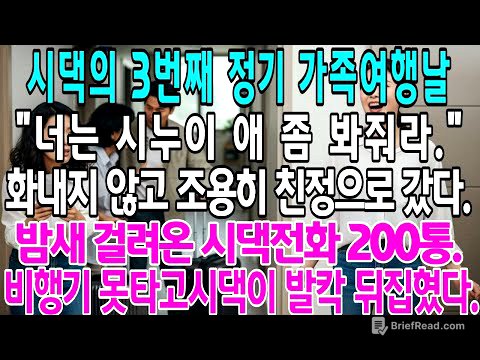
![[타로] 연애운 "기" 받아가세요🌹 역대급 5월 솔로 연애운 리딩🙌 설레는 연애 출발!!! 🚗](https://wm-img.halpindev.com/p-briefread_c-10_b-10/urlb/aHR0cDovL2ltZy55b3V0dWJlLmNvbS92aS9JM1pWeExKR2ZHOC9ocWRlZmF1bHQuanBn.jpg)